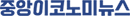죽음을 예술로 남긴 시대가 있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모습을 곱게 단장한 후 사진으로 남겼다. 지금 보면 기묘하지만, 그 시절엔 가장 따뜻한 작별 인사였다.
사진 한 장이 귀하던 시절, 살아 있을 때 사진을 못 남기는 경우가 많았고 죽은 뒤에라도 가족의 모습을 남기려 해 '죽음의 사진' 문화가 시작됐다.
놀랍게도 단순히 누위 있는 모습을 찍는게 아니라 의자에 앉거나 서 있는 자세로, 심지어 눈동자를 그려 넣어 살아 있는 듯 연출도 했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사진을 찍기도 했고, 세상을 떠난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의 모습도 남아 있다.
사진 속에는 고요하고 경건하며 꽃이나 십자가 같은 상징도 함께했다.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모습은, 당시엔 사랑과 기억을 남기려는 방식이었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장례 절차였다.
특히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 사진 한 장은 부모에게 단 하나뿐인 추억이 됐다.
사진이 일상이 된 뒤, 이 문화는 서서히 사라졌지만 사진들은 사랑을 담은 마지막 기억으로 남아 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이야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