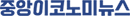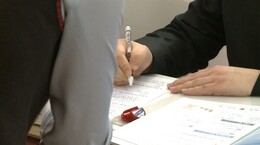백두산 정계비는 1712년 조선 숙종 때, 청나라와의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으로 당시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 일대의 정확한 국경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조선은 일찍부터 백두산을 신성시했고, 청나라도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부르며 건국의 발상지로 여겼다.
양국 백성이 서로의 국경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17세기 후반부터 이 지역은 주요 외교 현안이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이현일, 청나라의 목극등이 파견되어 현장 조사를 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비석에는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국경을 확정하는 내용이 새겨졌다.
그런데 토문강의 해석을 두고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다. 청나라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하고 조선은 더 북쪽에 위치한 송화강이나 그 지류로 해석했다.
계속된 논란은 이후 1885년 조중 국경 회담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1909년 일본과 청나라는 간도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신, 조선의 권리를 포기하고 송화강 일대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했다.
한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방 후 간도 협약은 폐기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은 두만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이야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