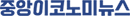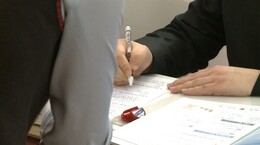또 사망사고…'624억 안전투자·대법관 위원회' 꺼낸 SPC, 그러나 신뢰도 낮아
2022년 SPL, 2023년 샤니, 2025년 삼립…위험한 구조는 여전했다
설비 리빌딩과 AI 도입 등 근본적 구조혁신 필요하다

[중앙이코노미뉴스 김국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SPC그룹이 반복해서 꺼내든 말이다. 그리고 매번 따라붙는 것은 막대한 ‘안전 투자’ 계획과 외부 위원회 출범 소식이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SPC는 이번에도 부랴부랴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했다.
SPC는 624억원 규모의 추가 안전 투자를 예고했다. 공장 자동화, 설비 교체, AI 감지 시스템까지 포함된 장대한 계획이다. 아울러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도 신설했다. 여기에 노동소위원회까지 설치하며 '정도경영'을 외쳤다.
전국 24개 생산센터에는 노·사·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안전점검이 이뤄졌고, 한 달 만에 무려 568건의 안전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SPC는 이 중 60% 이상은 즉각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작은 문제까지 챙기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도 반복되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이번 사망 사고가 SPC 계열사에서만 벌써 3년 연속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가 다르다. 외부 위원회나 예산 증액보다 중요한 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구조의 혁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PC는 이번 사망사고 직전까지도 “우리는 1000억원 넘게 안전설비에 투자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실제로도 그렇다. 2022년 평택 SPL 공장 사고 이후 SPC는 1000억원의 안전 투자와 'SPC안전경영위원회' 출범을 약속했고, 2023년부터 1년여간 약 969억원을 집행했다. 고강도 위험작업 자동화, 노후기기 교체, CCTV 설치, 안전문화 교육 등 항목은 화려했다.
그런데도, 이번엔 또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공정 구조의 ‘고질적 문제’가 명확히 지적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서. 이 기계는 3.5미터 높이에서 끊임없이 회전하며 갓 구운 빵을 식히는 설비로, 설계 자체가 위험을 안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뿐 아니라 SPC 전 공장에 47대가 설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패턴도, 공정의 위험성도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SPC는 ‘외부 위원회’, ‘노사 협의체’,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추려 했지만, 반복되는 사고가 이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번에도 SPC는 'AI 기반 스마트공장' 신설까지 언급하며 2700억원 투자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공장 구조와 교대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감시체계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시민사회는 이제 오너 일가에 대한 직접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위한 외침이다. 국회에서도 SPC 사태를 계기로 산업안전 청문회를 검토 중이며, 제도적 개선에 나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결국 SPC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관리 강화'가 아니다. 설비와 배치, 공정 동선까지 전면 리빌딩하고, AI 기술을 제빵 공정에도 적용하는 근본적 구조혁신이다.
산업재해는 작업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작업 설계와 환경에 원인이 있다. SPC처럼 반복 사고가 일어나는 사업장은 단속이나 교육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 설비 구조, 인력 배치, 교대 방식 등 근본적인 작업 환경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번엔 바뀌겠다"는 계획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번만큼은 진짜 외양간을 완전히 새로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