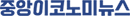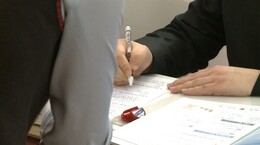나병인 가천대학교 겸임교수(행정학박사)

지금은 AI와 반도체의 시대다. 그리고 이 두 산업의 교차점에서 가장 빛나는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엔비디아(NVIDIA)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PC 그래픽카드 제조사로만 인식되던 엔비디아는 이제 전 세계 인공지능과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그 중심에는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Jensen Huang)의 독특한 리더십과, '끊임없이 다음 버전을 추구한다(Next Version)'는 사명(社名)의 정신이 있었다. 엔비디아라는 이름 자체가 'Invidia'(라틴어로 '부러움')와 'Next Version'를 결합해 만든 것이지만, 젠슨 황은 이를 단순한 상표가 아닌 기업 철학으로 구현했다.
젠슨 황의 경영 방식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비전, 즉 기술의 미래를 선점하는 전략에 집중했다. 그는 2000년대 초부터 CPU 중심의 컴퓨팅 패러다임이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범용 GPU(General-Purpose GPU)라는 개념을 밀어붙였다.
당시는 그래픽 처리를 위한 칩이 과학 연산이나 머신러닝에 쓰일 것이라고 믿는 이가 거의 없었지만, 황은 이 분야가 미래의 병목을 뚫을 핵심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렇게 시작된 GPU 연구는 단순한 화질 개선용이 아니라 대규모 병렬 연산을 처리하는 범용 연산 장치로 진화했고, 이는 훗날 AI 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특히 2006년 발표된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는 엔비디아의 미래를 바꾼 결정적 기술이었다. CUDA는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C, C++ 같은 친숙한 언어로 구현할 수 있게 해,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슈퍼컴퓨터 수준의 성능을 손쉽게 활용하게 만들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엔비디아를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시켰다. CUDA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전 세계 AI, HPC(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분석, 로보틱스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젠슨 황은 이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확장시키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CUDA를 단순히 유료 서비스로 묶어 판매하기보다, 전 세계 개발자 500만 명 이상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는 단기 매출을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GPU의 표준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실제로 AI 스타트업이나 대학 연구실에서 엔비디아 GPU와 CUDA를 학습하면, 이후 상용 서비스로 확장할 때도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인프라를 선택하게 된다. 이 ‘락인(lock-in)’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져, 경쟁사들이 진입할 틈을 좁혔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엔비디아의 전략은 치밀했다. 매년 새로운 GPU 아키텍처를 내놓으며, 연산 성능과 전력 효율을 꾸준히 개선했다.
맥스웰(Maxwell), 파스칼(Pascal), 볼타(Volta), 튜링(Turing), 앙페르(Ampere), 호퍼(Hopper), 블랙웰(Blackwell), 그리고 다음 버전인 루빈(Rubin) 아키텍처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AI와 HPC 워크로드 최적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담고 있었다. 이는 곧 AI 모델이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엔비디아 GPU 없이는 학습과 추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장 인식을 만들었다.
또한 젠슨 황은 반도체 시장의 단순한 ‘칩 공급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는 GPU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툴, SDK, 그리고 네트워킹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며 엔비디아를 하나의 ‘AI 인프라 패키지’로 만들었다.
DGX 서버, NVLink, Mellanox 인수 등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로써 고객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따로 조합할 필요 없이, 엔비디아의 통합 솔루션만으로 AI 인프라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젠슨 황의 리더십은 특유의 '기술 선구자'와 '스토리텔러'의 면모를 동시에 보였다. 그는 매년 GPU 기술 컨퍼런스(GTC)에서 신제품과 기술을 직접 발표하며, 단순한 제품 설명이 아니라 미래 비전과 기술 철학을 전달했다. 청중은 그의 발표를 통해 엔비디아가 단순한 부품 제조업체가 아니라, AI 시대를 여는 플랫폼 리더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결국 엔비디아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것은 단순히 GPU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젠슨 황은 기술 트렌드가 변하기 전, 이미 다음 세대 기술을 준비했고, 이를 생태계 확장과 플랫폼 전략으로 연결했다.
CUDA의 무료 개방은 개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속적인 GPU 아키텍처 혁신은 경쟁자를 따돌렸다. AI 붐이 터진 지금,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를 모두 갖춘 독보적 AI 인프라 기업이 되었고, 이는 단기간에 무너질 수 없는 진입 장벽이 됐다.
향후 몇 년간 엔비디아의 우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AI 모델의 규모와 복잡성이 계속 커질수록, 이를 뒷받침할 병렬 연산 인프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경쟁사들이 GPU 대안을 내놓더라도, 이미 구축된 CUDA 생태계와 500만 명 이상의 개발자 기반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젠슨 황은 여전히 ‘다음 버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그는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로보틱스 등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며 엔비디아의 기술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한 기업이 어떻게 기술 혁신과 생태계 전략, 그리고 리더십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
젠슨 황의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업'이라는 철학은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 산업에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기술의 최전선에서 다음 버전을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의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